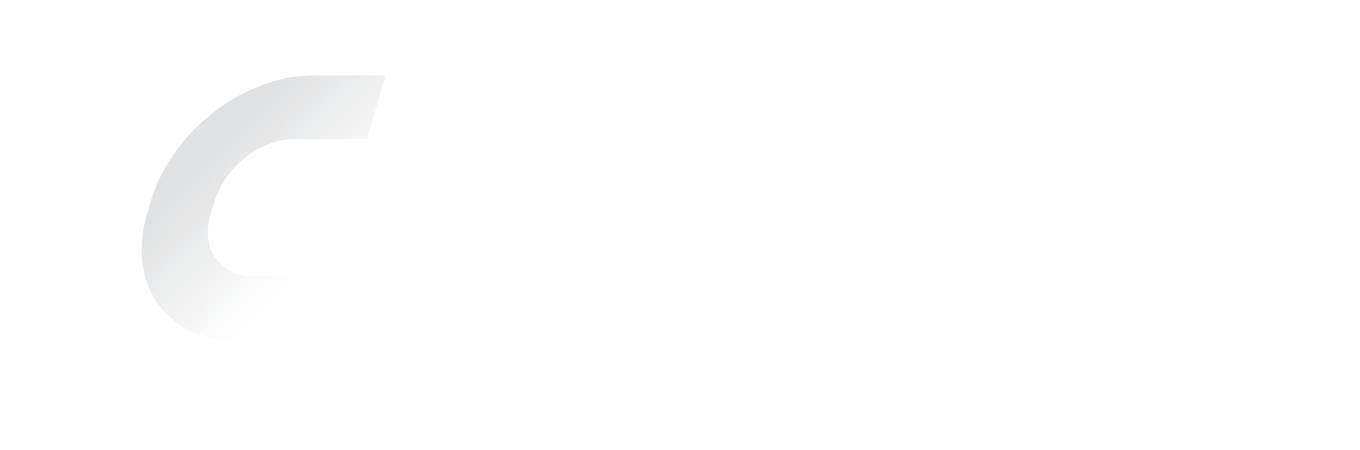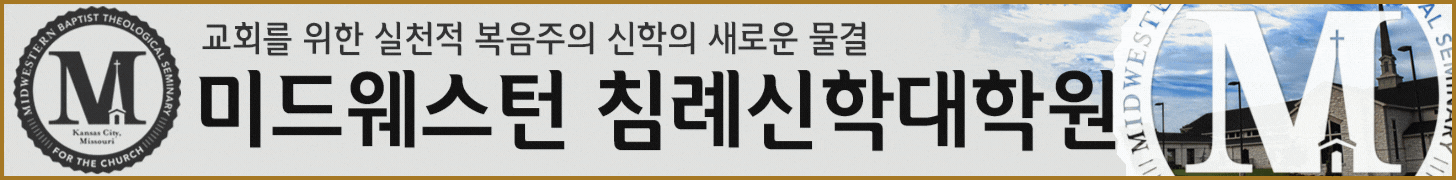현재 Dallas Baptist University에서 겸임교수로 학생들에게 생명 과학을 가르치고 있다.
반응과 응답의 차이는 무엇일까? 반응하다(React)의 라틴어 어원을 살펴보면 “Taking action back to someone”라는 뜻이 담겨있다. 즉 상대방에게 어떤 행위를 되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반면 응답하다(Respond)의 라틴어 어원은 “Answering back to someone” 이라는 뜻으로 상대방에게 대답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비슷하게 들리지만 여기엔 큰 차이가 있다. 반응(Reaction)은 어떤 자극에 대해서 본능적, 자발적, 감정적으로 발생하는 행동을 말한다. 시험관 속의 화학반응처럼 어떤 자극은 기본 욕구나 본능에 호소하여 즉각적인 감정을 불러 일으킨다. 감정이 생기는 것 자체는 자발적인 현상이라 의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감정이 여과되지 않고 곧 바로 행동으로 옮겨 간다면 자극에 대해 반응(Reaction)한 것이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불교의 일곱 가지 감정(칠정)에 익숙하다. 희(喜):기쁨, 노(怒):노여움, 애(哀):슬픔, 락(樂):즐거움, 애(愛):사랑, 오(惡):미움, 욕(欲):욕심. 유교에서는 네 번째 락(樂:즐거움)을 빼고 구(懼:두려움)을 넣어 칠정을 정의한다. 한편 미국의 심리학자인 Paul Ekman은 기본 감정을 기쁨(Happiness), 슬픔(Sadness), 공포(Fear), 분노(Anger), 혐오(Disgust), 놀람(Surprise) 6개로 구분했다. 기쁨을 제외한 모든 감정은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감정이지만 개체의 생존에 필수적인 감정들이다. 우리에게 두려운 감정이 없다면 악어가 득실대는 나일강도 서슴없이 건너는 평안을 누리겠으나 그 날 우리는 “요단강”도 함께 건너게 될 것 아닌가? 이렇듯 특별히 목숨이 위협받는 생존 경쟁의 무대에서 공포, 분노, 놀람 같은 감정 반응은 생존의 확률을 높인다. 투쟁 혹은 도피 반응(Fight or flight response)이라고도 알려진 이 생리적 반응은 외부 스트레스나 공격 혹은 위협에 대해 신속히 대처하도록 우리 뇌에 내재 되어 있다.
그러나 인간은 생존이 화두인 대자연이 아니라 자아 실현을 꿈꾸는 문명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다. 인간은 감정대로 반응하다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를 경험해왔다. “흥분한 나머지…”, “주체하지 못하고…”, “홧김에…”이란 문장 다음에 나오는 보복, 난폭운전, 기물 파손, 폭행, 방화, 살인과 같은 거친 단어들은 감정을 통제하지 않고 그대로 반응한 결과를 말해준다. 반면 응답(Response)은 사려 깊고 신중한 행동에 속한다. 응답에는 감정을 잠시 제어하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이 있다. 응답은 그 상황에 선택 가능한 행동들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합리적으로 결정된 사항을 행동으로 내보내는 과정이다.
반응과 응답의 차이는 우리 뇌의 구조 속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감정과 정서의 중추는 뇌의 측두엽 안쪽에 위치한 편도체(Amygdala)라는 조직에 있다. 이 조직은 아몬드와 비슷한 모양을 갖기에 아몬드를 뜻하는 그리스어 “Amygdale”에서 이름을 따와 영어로 Amygdala로 불리게 되었다. 편도체는 정서적인 정보를 처리하여 감정을 불러 일으키는데 특히 공포에 대한 학습 및 기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곳에서 일차적으로 발생된 정보는 우리 이마에 해당되는 전두엽(Prefrontal cortex)으로 보내진다. 자극에 대해 응답이 이뤄지는 곳이 바로 전두엽이다. 전두엽은 욕구, 충동, 감정을 통제할 뿐만 아니라 행동을 계획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고차원의 행정 업무를 담당한다. 정리해보자면 편도체(Amygdala)가 감정과 정서를 담당하며 자극에 반응(React)하는 곳이라면 전두엽(Prefrontal cortex)은 고차원적인 판단 및 인지 능력을 통해 자극에 응답(Respond)하는 곳인 것이다.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편도체는 완전히 성장하는 반면 전두엽은 뇌조직 중 가장 늦게 발달된다. 사춘기를 상징하는 질풍노도의 시기 혹은 이유 없는 반항의 행동 뒷배경에는 편도체와 전두엽의 발달 불균형이 있었다.
우리의 감정은 분명히 존중 받고 욕구는 적절히 해소되어야 한다. 관건은 이것들이 폭발적으로 확장되어 죄에 이르지 않게 하는 것에 있다. 양심, 의지, 지성, 이성, 영성을 동원하여 감정과 욕구를 적절히 다룬 후 행동으로 내보내는 것이 응답의 의미이다.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가는 원자로의 연료와 원자폭탄에 들어가는 핵탄두의 원료는 플루토늄 239로 똑같다. 핵연쇄반응을 통제하여 내보내면 생산적인 전기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지만 통제하지 않고 한꺼번에 내보내면 세상을 초토화시키는 핵무기가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반응과 응답의 차이는 이처럼 극과 극일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반응에서 응답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 많은 전문가들은 멈춤을 이야기 한다. 나를 자극하고 있는 것에 대응할 시간을 확보하라는 것이다. 멈춤의 시간은 자신이 상황과 감정에 의해 압도당하는 것을 막아 줄 뿐 아니라 내 감정을 분석할 기회를 제공한다. 편도체에서 형성된 감정과 욕구가 그대로 행동으로 분출 되기 전에 전두엽에서 이것들을 붙잡고 적절히 다루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듣는 것은 속히 하되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을 더디 하라는 성경의 권면도 반응에서 응답으로의 전환을 위해 시간을 확보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올림픽 영웅들은 자신의 동작을 머리 속에 그려보는 것에서부터 실제 경기에서 느낄 법한 감정이나 예상되는 변수들을 상상 속에서 소환하여 대처해 보는 멘탈 리허설을 해왔다. 스톤 브라이어 교회의 척 스윈돌 목사는 우리가 범하기 쉬운 죄와 그 결과를 마음 속에서 그려 놓고 마음 속에서 종종 리허설 할 것을 요구했다. 죄의 결과로 경험 할 수치와 후회, 잃는 것들을 헤아려 보면 죄를 경계하게 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이성적인 응답으로 인해 얻는 것과 충동적인 반응으로 잃는 것들을 마음 속에서 리허설 해보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생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