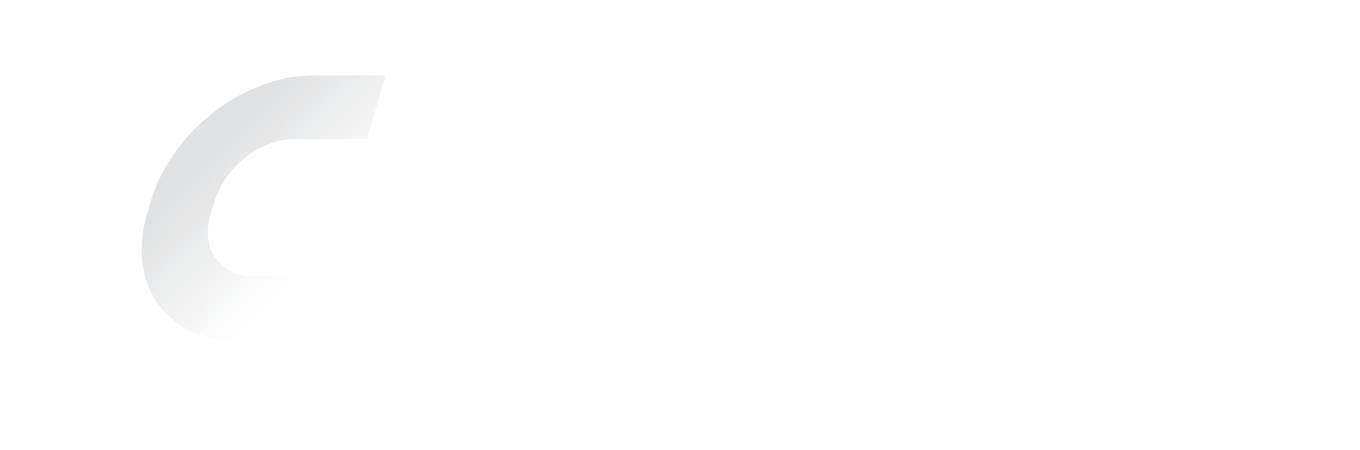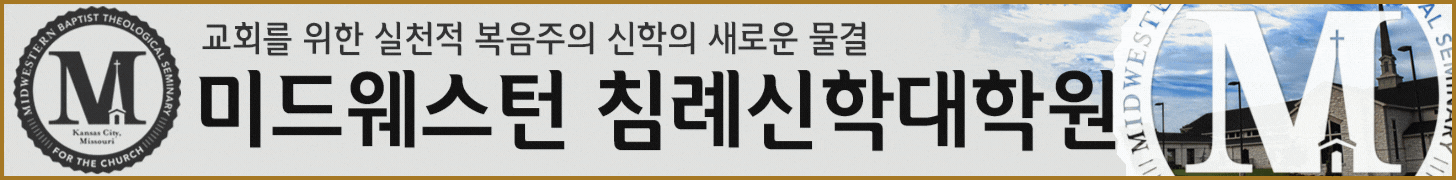UT사우스웨스턴 의과대학에서 콜레스테롤 대사관련 질병을 연구하는 과학자이다.
현재 Dallas Baptist University에서 겸임교수로 학생들에게 생명 과학을 가르치고 있다.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본 일이 있는가?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 찾아다니는 산기슭의 하이에나, 나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표범이고 싶다. 산정 높이 올라가 굶어서 얼어 죽는 눈 덮인 킬리만자로의 그 표범이고 싶다.” 1985년 발표된 조용필의 “킬리만자로의 표범”이라는 곡의 가사이다. 이 곡에서 하이에나를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 찾아 다니는 존재로 묘사했지만 사실 하이에나는 사냥 능력이 있고 사냥도 직접 하는 짐승이라 좀 억울할 듯하다. 굳이 따지자면 표범이나 사자들도 배고프면 죽은 짐승의 고기에 관심을 갖긴 마찬가지이니까 말이다.
여기에 하이에나 보다 진정 짐승의 죽은 고기만을 찾아 다니는 동물이 있다. 그것은 동물 사체 전문 청소부로 알려진 대머리 독수리이다. 짐승의 사체가 있으면 어김없이 하늘에서 맴돌다 내려 앉아 득달같이 사체를 뜯어먹기에 하이에나와 더불어 곱지 않은 이미지를 갖지만 재평가되어야 할 동물이기도 하다.
대머리 독수리를 언급할 때 영어에서는 Eagle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Vulture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사냥 능력이 있는 Eagle과 달리 사냥 능력이 없어 짐승의 사체만을 먹으며 살기 때문에 구별하여 Vulture라고 부른다. 외모에서도 Vulture와 Eagle은 쉽게 구분된다. Vulture는 머리에 깃털이 없거나 주름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대머리 독수리라고 부르고 Eagle은 깃털이 멋있게 덮여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독수리라고 부르는 것이다. 반면 한국어에서는 Vulture이든 Eagle이든 이 둘을 구별하지 않고 독수리라고 부르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 반전이 있다. 독수리의 “독(禿)”은 대머리를 뜻한다는 점이다. 독수리라는 말 자체는 “대머리 수리”라는 의미로 이미 대머리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Vulture를 “대머리 독수리”라고 부른다면 이는 대머리를 두 번 말하는 것이므로 겹말이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냥 능력이 탁월한 Eagle은 그냥 “수리”라 불러야 하고 반면 동물 사체만을 찾아 다니는 Vulture는 “대머리 수리” 즉 “독(禿)수리”라고 불러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일상 한국어에서는 이 둘을 사실 혼용해서 독수리라 싸잡아 부르니 억울한 쪽은 수리가 아닐까 한다. 머리 숱이 그렇게 멋지고 많은데 대머리라는 이름을 들어야 하니 말이다.
참고로 미국의 상징인 흰머리 수리를 영어로 Bald Eagle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도 반전이 있다. Bald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머리를 뜻하는 말이 아니다. 여기서 Bald라는 단어는 흰색 (White)을 뜻하는 옛 영어 단어인 “Balde”에서 나왔다. 따라서 Bald Eagle을 우리말로 흰머리 수리로 번역하는 것이 맞는 표현이 된다. Bald를 대머리로 해석하면 오역이고 Bald Eagle을 “대머리 독수리”로 번역하면 “대머리 대머리 수리”가 되는 것이니 수리 입장에서는 오역을 넘어 오열할 지경이 된다. 그냥 흰머리 수리이다.
독수리(Vulture)가 사라지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까? 1980년 4천만 마리였던 독수리 개체수가 2007년 40만 마리로 감소하는 일이 인도에서 발생했다. 99%의 독수리가 사라진 것인데 원인은 소가 아플 때마다 투여하던 Diclofenac이라는 항염제였다. 인도에서는 소를 신성시 여기기 때문에 소가 자연사하게 될 경우 이를 자연에 버려 두는 전통이 있다. 이때 버려진 소의 사체는 독수리(Vulture)의 몫이었다. 하지만 소의 사체에 남아 있던 Diclofenac은 의도치 않게 독수리들의 신장을 망가뜨리는 독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독수리들의 수가 급감하게 된 것이다. 독수리의 빈자리는 야생 개들의 차지가 되었다. 야생 개들이 소의 사체를 먹기 시작하면서 개들의 개체수가 급격하게 늘어났는데 문제는 개들이 동물의 사체처리에 있어서는 독수리(Vulture)만 못하다는 점이다.
독수리는 하늘을 날며 내려오기 때문에 누구보다 빠르게 사체를 발견하며 1.6 km에서도 사체의 냄새를 맡을 수 있다. 평균 1분에 1kg의 고기를 해치우며 뼈에 붙은 살점도 깨끗이 먹어 치우기 때문에 탁월한 사체 청소부 (Scavenger)가 된다. 머리를 파묻고 썩은 사체의 살을 먹을지라도 대머리라 균이 옮겨붙을 깃털이 없다. 그리고 머리에 균이 달라붙더라도 강한 햇볕에 노출되기 때문에 쉽게 멸균되고 만다. 무엇보다 독수리의 경우 인간의 위산보다 100배나 강력한 위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탄저균(Anthrax)이나 광견병 바이러스 (Rabies) 등을 효과적으로 걸러낼 수 있다.
하지만 개들의 경우 이런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소의 사체를 먹으며 5백만 마리 이상 늘어난 개들은 쉽게 이런 병원균에 감염되었고 사람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 때 옮겨진 광견병 바이러스(Rabies)로 인해 4만 7천 명 이상의 사람이 인도에서 사망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광견병은 물린 자국의 위치에서부터 바이러스가 신경을 따라 뇌로 서서히 이동하는 발병과정을 가지고 있다. 개에게 물리더라도 바이러스가 뇌에 침투하기 전 가급적 신속히 백신을 맞으면 치료 가능하지만 일단 뇌로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치사율이 거의 100%에 가까운 매우 치명적인 질병이다.
결과적으로 독수리(Vulture)가 없어지니 광견병(Rabies)이 창궐한 것이다. 이 사실을 알면 독수리가 대머리인 것이 곱게 느껴지고 짐승의 사체를 처리해 주는 것이 그저 고맙기만 하다. 자연에 외모 지상주의는 없다. 만들어지고 존재하는 것은 모두 특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