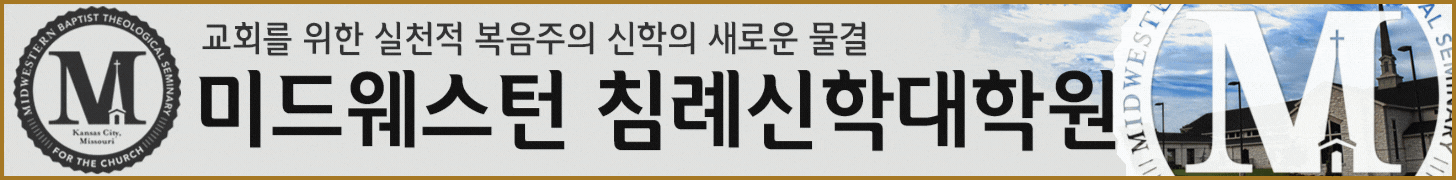하나님은 광야를 지나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셨다. 그러나 그 만나는 아무 제약 없이 주어진 양식이 아니었다. 만나에는 분명한 법칙이 있었다. 크게 네 가지다. 하나님은 그 법칙을 통해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씩 벗겨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훈련하셨다.
첫째, 만나는 아침에 내렸고 해가 뜨거워지면 사라졌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스러졌더라.”(출 16:21)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는 시간에 나가 거두어야 했다. 노예로 살 때에는 강제로 아침에 일어나 작업장으로 향해야 했다. 그러나 광야에서는 아무도 강제하지 않았다. 자유가 주어졌다. 하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아니라, 스스로 움직여야 하는 자유였다. 아침에 일어나지 않으면 그날의 양식은 얻을 수 없었다. 하나님은 하루를 시작하는 태도부터 새롭게 빚고 계셨다.
정해진 시간은 인간을 얽어매기보다 오히려 삶을 바로 세운다. 예배와 기도의 시간도 마찬가지다. 인간은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여길 때 오히려 길을 잃기 쉽다. 그래서 성경에는 인간이 스스로 정하지 못하도록 주어진 경계들이 있다. 선악과, 절기, 안식일, 십일조와 같은 질서들이다. 광야의 만나는 그 질서의 연장선에 있었다.
둘째, 만나는 매일 거두어야 했다. 한 사람당 한 오멜, 약 2.2리터가 하루 분량이었다. 이것이 일용할 양식이었다. 하루도 건너뛸 수 없었다. 욕심을 부려 더 많이 거두어도 소용이 없었다. 남겨두면 다음 날에는 썩어버렸다. 광야의 삶은 ‘오늘’을 사는 훈련이었다. 육적인 양식을 위해 매일 나아가야 하듯, 영적인 양식도 매일 구해야 한다는 단순한 진리를 만나는 보여준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대신할 수 없고, 내일의 은혜를 미리 저장해 둘 수도 없다.
셋째, 매일 내리던 만나가 안식일에는 내리지 않았다.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출 16:25)
대신 안식일 전날에는 두 배를 거두게 하셨다. 여섯 날 동안 성실히 거둔 이들에게 하루의 쉼이 주어졌다. 이 쉼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회복의 시간이었다. 육체를 쉬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정돈하는 시간이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생존만이 아니라 삶의 리듬을 가르치고 계셨다. 육적인 공급은 영적인 회복을 위한 토대였다.
넷째, 많이 거두어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두어도 부족함이 없었다.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출 16:18)
광야에서는 비교가 의미를 잃는다. 하루치의 은혜는 모두에게 충분했다. 하나님의 공급은 계산의 논리가 아니라 은혜의 질서 안에서 주어졌다. 많이 거두는 능력이 아니라, 오늘을 신뢰하는 태도가 중요했다.
만나는 이스라엘에게 먹고 살기 위한 도구였지만, 하나님께는 사람을 빚는 도구였다. 생존의 문제 속에서 신뢰와 절제, 리듬과 공동체의 감각을 훈련하신 것이다. 먹고 사는 문제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배우게 하셨다.
하나님은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 보관하라고 하셨다(출 16:32). 그것은 광야를 경험하지 못할 다음 세대를 위한 기억이었다. 은혜는 한 세대에서 끝나지 않는다. 신앙은 개인의 체험을 넘어 다음 세대를 향한 책임을 포함한다. 믿음으로 사는 삶, 그리고 자녀를 위한 기도는 그 연장선에 있다.
광야의 만나는 오래전의 이야기이지만, 오늘의 삶과도 닿아 있다. 하루를 살게 하시는 공급, 일터에서 얻는 양식,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작은 ‘만나’를 경험한다. 하루치 은혜가 쌓여 인생이 된다.
오늘도 주어진 하루를 통해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돌아볼 일이다. 매일 주시는 은혜를 알아보는 눈, 그것이 광야를 통과하는 사람의 태도일 것이다.
하루를 살게 하시는 공급, 일터에서 얻는 양식,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작은 ‘만나’를 경험한다. 하루치 은혜가 쌓여 인생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