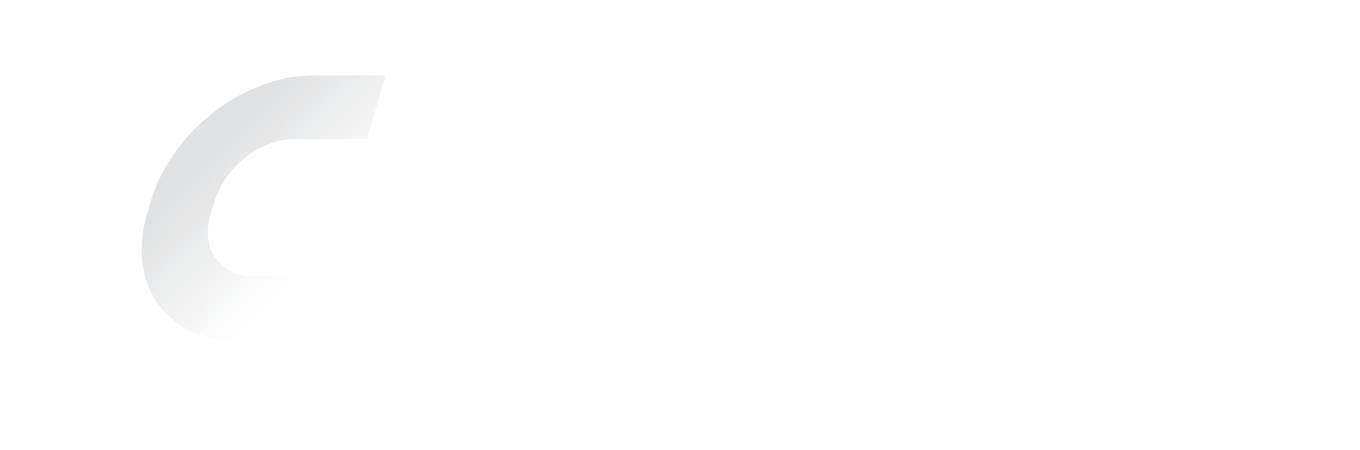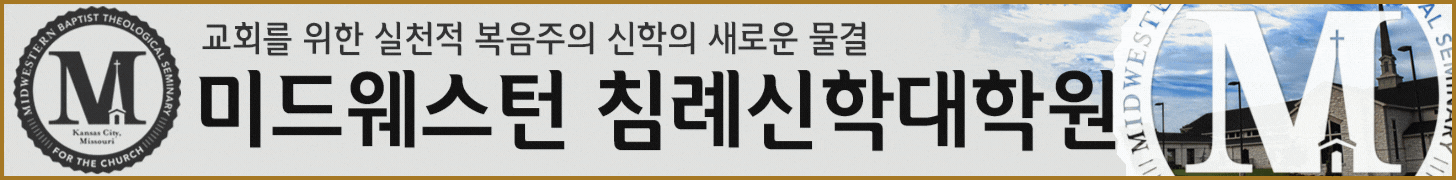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부교수
비서구권에 사는 한국 교민 가정에서는 이주한 나라의 언어보다 한국어를 우선시하고, 국제학교에서는 영어로 교육을 받는 경향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2세들은 한국어, 영어, 현지어 사용이 가능한 다중언어 세대가 되었습니다. 미국에 유학 온 비서구권 이민자 가정의 청년들은 영어 뿐만 아니라 한국어 사용도 문제가 없더군요. 게다가 현지 언어 또한 어려움 없이 활용하는 유학생들을 만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반면에, 소위 선진국인 북미주나 서유럽에 사는 한인들에게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이 있습니다. 이민 2세들이 모국어인 한국어 사용을 매우 불편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서구권을 동경해 오던 이민자들은 되도록이면 자녀들이 그 사회에서 빨리 적응해서 사회적, 경제적 혜택을 누리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이민 온 가정 안에서도 한국어보다는 영어를 사용하도록 권장했었지요. 그 바람에 자녀들의 한국어 사용이 매우 서툴러서, 부모와의 소통도 쉽지 않은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아마도 한국의 국력에 비례해서 모국어 사용 비율도 달라지는 것 같더군요.
그래서 그런지, 자녀에게 신앙 전수를 하는데 언어 장벽을 가장 큰 장애요소로 손꼽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나눔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지요. 사실, 내가 다음 세대에 관심을 끌게 된 첫 계기는 1983년에 성경번역 선교훈련을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당시에 아내와 나는 달라스 남쪽에 위치한 던컨빌이라는 도시 근처에 소재한 성경번역선교 교육기관인 SIL(Summer Institute of Linguistics)에서 교육을 받고 있었지요. 그러던 중에 던컨빌 고등학교에서, 이 학교에 다니던 한인 학생을 만나 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이 학생이 더는 학교에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다는 거였죠. 아내가 그 학생을 만나본 결과, 부모는 생계를 위하여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하러 밖에 있어야 했고, 이 학생은 혼자서 집안에 남아있었다는군요. 이런 생활이 지속되면서, 아이와 부모 사이의 소통은 막혀버렸고, 대화를 하려고 해도 이미 한국어가 서툴어진 아이와 대화가 되지 않았던 거지요. 이 학생은 점점 더 정서적으로 메말라가면서 결국에는 학교에서 문제 학생으로 분류되어 특별 관리를 받아야 하는 지경까지 오게 된 거였습니다.
이 케이스를 접하면서, 분명히 이 아이의 부모가 미국 땅으로 오게 된 이유가 아이를 위해서 였을 텐데, 오히려 아이가 망가지게 된 아픔을 겪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결국은 자녀를 위해 열심히 돈을 벌어서 자녀의 뒷바라지를 한다고 했지만, 그리고 좀더 풍요로운 생활을 위하여 힘을 다했지만, 남은 것은 자식의 이탈이었지요.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그런 한편으로는, 자녀와 소통할 방법도 알지 못했고, 소통할 시간도 내지 못했던 그 부모를 보면서, 우리는 부모로서 아이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가야 할 것인지 내심 고심이 되었습니다. 이 케이스가 우리로 하여금, 자녀와 소통하기 위하여 어떤 관계성을 자녀들과 맺어가야 할지 고민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위 학생을 만났을 즈음에 우리는 미국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담임목사가 공석 중인 한 한인교회의 요청을 받고 담임목사가 올 때까지 돕기로 하고 그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우리는 중고등부와 유년주일학교, 그리고 어른들을 위한 주일 성경공부를 주관하고, 주중의 소그룹 모임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소그룹 리더를 뽑아서 훈련시켰습니다.
그 교회는 30대와 40대가 대부분이었고, 학력도 매우 높았습니다. 20대 이상 어른이 약 30명 정도에 아이들까지 합하면 50여명 정도되는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 우리 부부가 그 교회에서는 제일 젊은 축에 속했구요. 그런데 그 당시 이민 온 한인들이 주류 백인사회로 진출하려는 노력이 컸기 때문에 교회 안의 가정들도 부모와 자녀들 사이의 대화는 거의가 영어로 이뤄졌습니다. 한인 사회의 분위기가 주류사회로 진입하는 것이었기에, 당연히 한글학교는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한글학교가 한 개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학교에 등록하여 다녔던 학생 수가 그리 많지 않았지요. 그 당시에는 한 아이라도 오면 반가웠던 시절이었습니다.
특히, 이 교회의 구성원들의 교육 수준이 높았기 때문인지 영어로 아이들과 소통하는 것을 부모들이 선호했습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들일 경우에는 부모의 영어가 지적거리가 되지 않았지만, 10대 아이들에게는 부모의 영어가 지적거리가 되는 것을 목격하곤 했지요. 그러다 보니, 이미 한국어가 불편한 아이들과 영어가 서툰 부모가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이 버겁게 보였지요.
게다가 부모와 자녀 사이의 소통의 어려움이 언어 장벽만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두 세대 사이의 문화적 차이였습니다. 한국 문화에서 자란 부모와 미국 문화에서 자라는 자녀들 사이에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둘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거지요. 또한 문화의 차이에 더하여, 세대 차이 때문에 두 세대 사이의 간극이 크게 벌어져 있더군요.
이런 단절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시기에 부모와 십대 아이들 모두 서로에 대한 갈등을 경험하면서도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현실 앞에 힘들어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대화를 나누기 싫은 아이들의 표정과 눈초리 앞에서, 그리고 저 아이들을 어떻게 좀 해달라고 나를 그 아이들 앞에 내세우는 부모 앞에서 느꼈던 막막한 심정을. 저 아이들에게 변화를 요구하기보다는 그 부모에게 변화를 요구할 것이 더 큰데, 막상 대부분의 부모들은 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더군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부모되기를 홀로 겪어낸 그 당시 부모들은 확실히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어쩌면 그 상처를 지금도 여미고 있는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