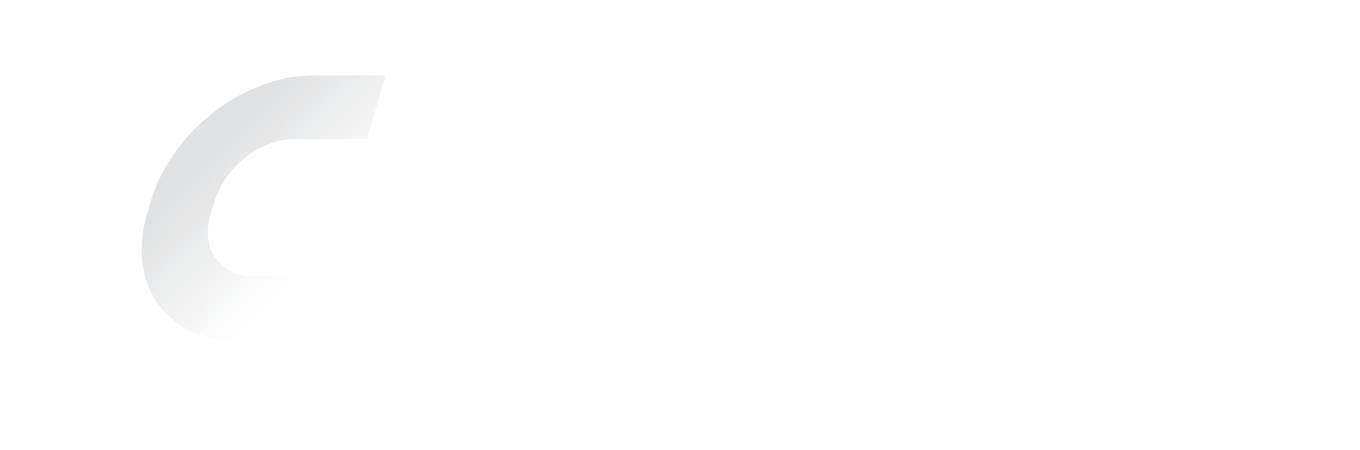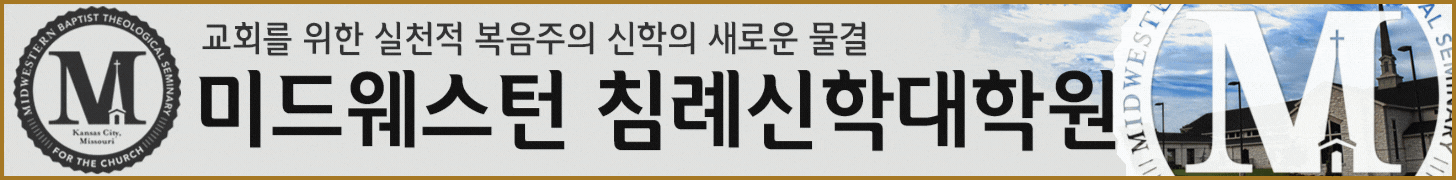지인이 자작나무 숲을 여행한 후에 동영상을 보내줬다. 동행하지 못한 아쉬움을 달래라는 표현이었다. 숲속에 하얀 나무가 각자의 위치에서 숲을 지키는 자작나무 숲은 경이로웠다. 다른 나무들과 달리 시선을 끌었고 낯선 모습이었다. 그 나무는 몸에 흔적을 품고 무늬를 만들어 그 나무만의 특별한 상징처럼 느껴졌다. 사람 눈을 닮은 듯한 나무의 상처 부위에 마음이 머물렀다. 동공을 둘러싼 모습은 깊고 쓸쓸했다. 어떤 사연을 품고 있기에 그토록 강렬한 흔적을 새겼을까. 자작나무에 새겨진 상흔이 궁금했다. 가지가 떨어져 나간 자리는 나무의 무늬를 따라 소용돌이치듯 굳어지면서 흔적을 남긴단다.
필자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바이올리니스트 한수진 님이 어느 매체를 통해 신앙 간증한 내용을 들었다. 그녀는 선천적으로 한쪽 귀에 청각장애를 안고 태어났다. 한 세대 걸러 유전이 되는데 돌연변이 영향으로 그녀가 청각장애를 안고 태어났단다. 그녀의 어머니도 바이올리니스트였다. 아버지는 해양생물학자라고 한다. 한국에서 태어나 두 살 때 영국으로 건너가 섬에서 생활했다고 한다. 어릴 때 사고를 당해 생명이 위태로웠는데 부모님의 기도로 응답받고 살아났단다. 그녀의 어머니는 본인이 활동하는 것보다 딸을 양육한 것이 가장 잘한 일이라고 했다. 그녀는 연주 활동을 하지 못하는 힘든 시기에 아버지와 자주 통화하며 한 시간 정도 신앙 얘기와 독서 얘기를 했다고 한다.
바이올리니스트가 한쪽 귀에 장애가 있어 들을 수 없으니 어떤 상황일지 짐작할 수 있으리라. 일반 청중들이 듣는 것과 다르게 들리기 때문에 본인만의 연습과 청각 훈련을 한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인고의 시간을 지나왔을지 가늠하기 어렵다. 그녀에게 그런 시간이 있었기에 영혼을 울리는 깊은 음을 내는 것이 아니었을까. 그녀는 또한 턱관절 건강문제로 6년 동안 공백기가 있었다. 첫 번째 수술이 잘못되어 많은 고생을 하며 긴 겨울의 터널을 지났다. 그녀가 지나온 삶을 듣고 그녀에게서 왜 그런 깊이 있는 음색이 나는지 알 듯했다. 그녀는 ‘결핍이 하나님의 은혜’ 라고 고백했다. 자작나무의 나뭇가지가 잘려나간 상처 부위에 단단한 옹이가 생겨나듯 그녀의 결핍이 그녀가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되는 자양분이 되었으리라. 그것이 아름다운 옹이로 남아 깊은 울림을 주는 연주자가 된 것이 아닐까.
자작나무는 위도가 높은 곳에서 자란다. 북위 40도 이상의 추운 지역에서 서식한다. 시베리아, 북유럽, 동아시아 북부, 북아메리카 북부 숲이 대표적이라고 한다. 20세기 후반 이후에는 자일리톨 성분을 추출하여 천연 감미료로 사용하고 있다. 핀란드나 러시아에서는 사우나를 할 때 자작나무 잎을 말린 것을 사용한다. 껍질에는 기름기가 많아 습기에 강하고, 오랫동안 잘 썩지 않고 불에 잘 타는 특징이 있다. 방수성이 우수해 북미 원주민들이 카누를 만들거나 여진족들이 배를 비롯한 각종 생활 용구의 재료로 사용했다고 하니 사람들의 삶에 다양하게 유익을 주는 나무다. 과거 고구려나 신라에서는 종이 대용으로 사용했고 천마총의 천마도 그림이 이 자작나무 수피로 만든 것이라니 정말 놀랍다.
자작나무의 수피에 함유된 성분은 진해, 거담, 항균작용을 한다고 하니 건강에도 유익한 나무다. 자작나무의 수피도 처음에는 보통나무처럼 갈색이지만 시간이 경과 하면서 갈색 껍질이 벗겨지고 수피에 함유된 베툴린산 물질이 빛을 반사해 흰색 빛깔로 보인다고 한다. 이유는 추운 지역의 큰 일교차로부터 수피 손상을 막기 위한 것이란다.
오래전에 사역했던 교회 청년부에서 필자가 제자 양육했던 자매가 바이올린을 맡긴 적이 있다. 스트라디바리우스가 제작한 것으로 고가의 바이올린이었다. 그 자매가 아끼는 악기인데 나에게 맡기고 마음껏 사용하란다. 그 바이올린을 자기 것으로 길들이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함께 호흡하며 지내왔을지 가늠이 되었다. 악기는 연주자의 연주 스타일에 따라 악기의 음색이나 톤이 달라진다.
악기 제작자 전문가에 의하면 알프스산맥과 발칸 반도 등에서 자란 나무로 악기를 제작하면 깊은 소리를 낸다고 한다. 단풍나무는 추운 지역에서 자란 나무일수록 더 깊은 소리를 낸다는 거였다. 겨우내 추위를 다 견디고 자라난 나무가 그 속에서 깊은 음을 낸다고 한다. 평지보다 골짜기에서 자란 나무일수록 더 견고하고 내구성도 강하다.
자작나무 옹이가 아름다운 이유는 독특한 상흔 때문이다. 내면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고 있는 듯한 선명한 눈빛이 오래 남을 듯하다. 자작나무의 옹이가 상흔이 아니라 숲을 아름답게 빛내듯,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상처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갈망한다. 우리 내면의 숲에 아직 아물지 않은 생채기가 있다면 아름다운 옹이로 빚어지길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