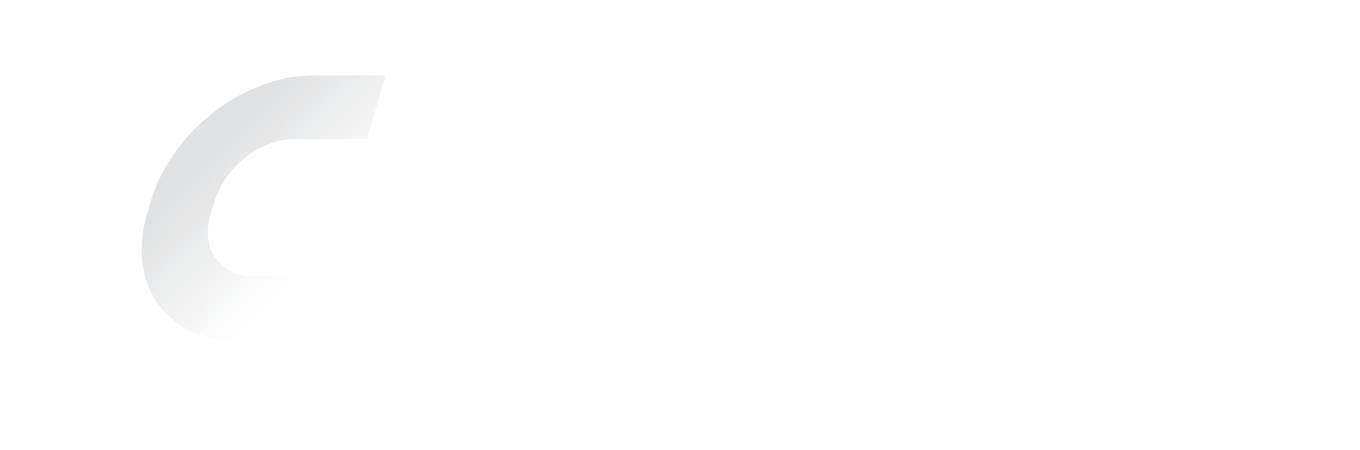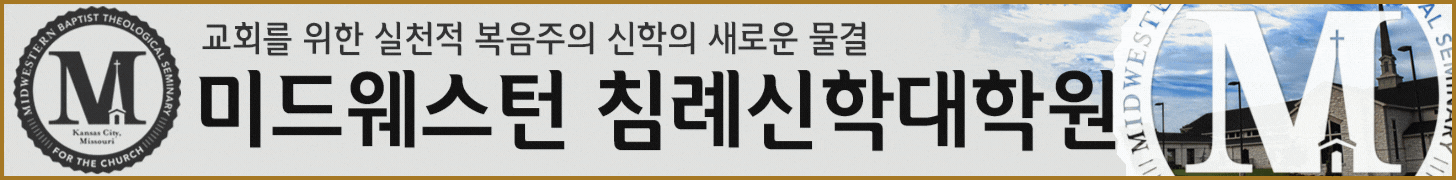센트럴신학대학원 겸임교수
프린스턴신학대학원 석사
하버드신학대학원 석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자기 비움은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빌립보서 2장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 2:6-8). 그리고, 참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자신을 비우셨듯이,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 겸손한 자기 비움의 삶의 모양을 가지라고 권고합니다. 빌립보서 2장은 우리의 자기 비움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가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경청하며 이를 받아들여 순종하는 것이라 암시합니다. 그리고,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있어서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겸손히 자신의 주장과 필요를 내려놓고 지체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제시합니다 (빌 2:3-4).
그런데, 이처럼 자기 비움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매우 핵심적인 신앙의 자세이자 덕목인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살다 보면, 이 자기 비움을 차마 하지 못할 것 같은 순간들을 마주하게 되기도 합니다. 가령,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고 살았지만, 내가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산과 같은 어려움들을 계속 마주하며, 때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순종할 힘을 잃고 지쳐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또, 오래 인내하며 이웃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려 애썼지만, 그 과정에서 점점 소진되어 이제는 그 사랑의 자리에 무의미함과 쓴 뿌리의 재만 남은 것 같은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자기를 비워 순종과 이웃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힘과 숨이 모두 다 타버리는, 번아웃을 경험하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묻게 됩니다. 다 타버린 우리가 자기 비움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더 비울 수 있는 것이 남아있는 것일까, 하고 묻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 소진된 상태에 있는 우리의 자기 비움의 가능성에 관련하여, 몇몇 현대 신학자들은 삼위일체의 자기 비움에서 그 모델을 찾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은 서로 동일한 본질을 지니시면서도, 또한 서로 구분되는 위격으로 계시기에, 이 서로 다른 세 분의 위격은 서로와 ‘관계’를 맺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온전한 하나가 되기까지 사랑하는, 깊은 사랑의 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몇 현대 신학자들은, 세 위격의 하나님이 이처럼 서로와 사랑의 관계를 맺는 가운데, 서로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자기 비움으로서 서로를 사랑하고 계시다고 이야기합니다. 가령, 스위스의 가톨릭 신학자 한스 우르스 폰 발타사르는 성부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본성과 생명을 성자와 성령에게 내어주심으로써 성자와 성령을 사랑하시고, 성자는 그것에 대한 감사로서 자신의 모든 존재를 담은 순종을 성부께 드림으로서 서로를 사랑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Hans Urs von Balthasar, Mysterium Paschale). 즉, 삼위일체의 각 위격이 서로를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비워 서로에게 줌’으로써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담 대학교의 정교회 신학자인 아리스토틀 파파니콜라우는, 발타사르가 제시한 삼위일체의 상호 자기 비움의 모습이 단순히 일방적인 자기 내어줌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합니다. 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를 위해서 자신을 비우는 것에는, 서로를 위해 ‘각자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도 포함되지만, 동시에 각자가 자신을 비움으로써 다른 위격이 자신에게 제공해주는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수용’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Aristotle Papanikolaou, “Person, Kenosis and Abuse”). 삼위일체의 자기 비움에는 자기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로부터 ‘받는 것’ 역시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파파니콜라우는 삼위일체가 제시하는 자기 비움의 모델은 상대를 위해 기꺼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기꺼이 받는 자세라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비우며 순종과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때로, 자신을 다 잃어버린 듯한, 소진되는 때를 마주합니다. 엘리야가 여호와께 순종하여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도 대적하여 이겼지만, 큰 승리 이후에도 전혀 변하지 않는 현실을 마주했을 때, 그는 순종으로 자기를 비워왔던 삶에 대하여 낙담하고 무너집니다. 모세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여 이들을 이끄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 하나님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충성스럽게 헌신했지만, 사람들의 이해 부족과 끊임없는 요구, 그리고 끝없는 갈등 속에서 몸과 마음이 소진되어 갑니다. 이럴 때, 이미 다 비워질 만큼 비워진 우리에게, 자기 비움이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없는 에너지를 쥐어짜며 나를 주기 위하여 비우는 것보다도, 적어도 자기가 이미 다 비워진 이 때에는, 하나님과 다른 이웃들이 그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도록 ‘자신 안에 공간을 만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기까지 절망했던 이 때에, 그는 자신을 ‘비워’ 하나님께서 그에게 조용히 다가오시고 그를 먹이시고 채우실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혼자 백성들을 돌보며 소진되어가고 있던 모세에게, 그의 장인 이드로는 공동체 다른 이들의 도움을 받고 그의 책임감을 좀 ‘비우라’ 청합니다. 자기가 자신을 책임질 뿐더러 하나님과 이웃의 섬기는 일까지 감당해내려는 습관을 지닌 우리에게, 때로 그저 채움을 받고 도움을 받는 일은 이런 우리의 독립성과 주체성을 좀 내려놓고 비워내는 겸손함이 필요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영국 성공회 신학자 사라 코클리는 기독교의 자기 비움이란, 무조건적인 자기 희생, 자기 소진이 아닌, 상대가 나에게 들어올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Sarah Coakley, God, Sexuality, and the Self). 때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기 비움이란, 너를 위해 나를 내어주는 것 뿐만 아니라, 내 안에 ‘너의 내어줌’을 받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