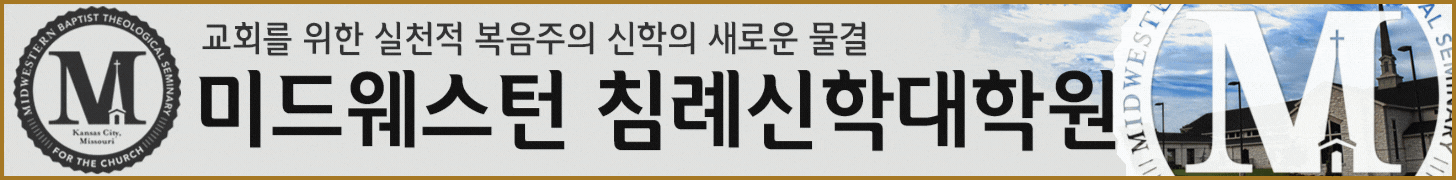-영자 엄마한테 엄마가 바리바리 싸서 보냈데.
-영자 엄만 그런 엄마가 있어 좋겠다.
어머니라고 불러야 어울릴것 같은데 엄마라고 하는 동네 아줌마들 수다가 어색하게 들리던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그 엄마들보다 나이가 많은데 엄마라고 해야 진짜 울 엄마 같은맛이 납니다. 다시 어려지는 건지, 이제야 철이 들어 엄마를 사랑하는 감정인지, 습관인지 헷갈립니다.
엄마는 만리재 큰길 쪽의 담장을 헐고 꾸며서 월세를 주었습니다. 그 당시 동네 처음인 미장원을 차려 원장이라던 여자는 계주를 하며 미용사와 시다 두 사람 월급과 월세를 여러 달 밀리더니 야반도주했다고 한참 시끄러웠습니다. 갈 데가 없다는 앳된 미용사의 부탁으로 1950년 대에 미장원 원장이 된 엄마. 신 유행 파마머리 엄마를 첩실이라고 학교 애들이 쑤군대는 것이 기분 나빴고 그런 엄마도 싫었습니다. 학교 근처 효창공원에 피란민들이 임시거처를 꾸려서 살 때인지라 한 반에 육십여 명에 9반까지 학생들이 오전, 오후로 가득 찼습니다. 직접 물었으면 답이라도 시원히 해 줄 텐데 불파마에 이어 토니파마가 유행하면서 미장원을 통해 동네 소식이 들풀처럼 번지던 때였습니다.
어머니날 선물을 푸짐하게 받고 난 오월의 끝자락에서야 엄마 이야기를 씁니다. 어릴 적 한 박자씩 늦어서 지청구를 들었습니다. 또 늦는다고 할까봐 서두르다 보면 물건을 떨어뜨려 깨거나 쏟거나 넘어져 무릎을 깨곤 했습니다. 두 무릎은 늘 새로운 상처와 검은 딱지와 멍을 달고 살았죠. 넘어지며 손바닥이 쓸려 방울 피가 맺히고 무릎에 피가 나도 <옥도정기 아까징끼>가 만병통치약이었습니다. 약아저씨와 엄마의 말을 들으며 늦어도 끈질기게 하면 되는 거라는 걸 그때 배운 것 같습니다.
-왜 저리 굼뜨고 데퉁맞은지 원…. 세 살 터울 제 언니는 천자문까지 떼고 국민학교 입학했는데 지 이름도, 1,2, 3,4, 도 겨우 그리고 있으니 어쩌면 좋을지….
갓난아기 때 아버지의 수혈로 겨우 살았다니 그래서 그럴 거예요. 한약 정리를 시키면 처음엔 제대로 할지 싶어도 얼마 지나면 정확해지고 빨라지더라고요. 놀고 싶을 텐데 끝까지했어요.
엄마 살아계실 때의 오월 모임 그대로 올해도 김 약국집 일남 사녀 가족과 후손들이 모두 모였다고 했습니다. 오자매 카톡방에 20여 장의 사진들. 무지개만큼 환하고 보고 싶은 얼굴들입니다. 엄마의 엄마이신 외할머니의 말씀이 들립니다. “아버지가 살았어도 작은댁 때문에 애비 없이 불쌍하게 큰 네 엄마야. 지에비 못된 승질 닮아 쌀쌀맞어도 경우야 밝지. 승질읍는 사람 읍자녀. 니 에미한테 잘하거라.” 외할머니는 마음 한켠에 자리한 한 겨울 구들목처럼 따듯한 분입니다. 오빠들 배울 때 어깨너머로 배운 언문 실력으로 팔십 연세에도 증손들 방에서 책 보시던 할머니, 겨울이면 ‘연탄아궁이에서 구워주시던 할머니표 따듯한 운동화. 위, 아래 치아가 대 여섯 개 남도록 말씀 안 하셔서 자식들 불효 만든다는 엄마의 타박에 ‘그래도 이걸로 씹어진다’라 코미디언처럼 웃으시든 할머니를 닦달하든 엄마가 싫었습니다.
늘 공부만 하라고 하는 엄마, 일제고사 백 점을 맞아도, 상장을 받아와도 으응 잘했구나, 아주 당연하다는 엄마의 반응. 나대로 힘들게 공부했는데, 활짝 웃어준 적도 등 두드려 주거나 머리라도 쓰다듬어 준 기억이 없습니다. 나는 늘 괄호밖의 아이였다는 생각이 들들었습니다.
엄마가 치매증세로 양로병원 계시다기에 서둘러서 갔습니다. 해외 출장지에서 사고로 먼저간 아들이 올 날을 기다리는 엄마. 어릴 적 부르던 동요 10여 곡을 함께 부른 후 “예수 사랑하심은….” 여전히 고운 음성으로 또박또박 부르는 엄마가 신기해서 조심스럽게 주기도문을 아시는지 여쭈었습니다. 친할머니 따라 교회다닐 때 알았다기에 함께 외우자, 큰소리로 아멘 하시는 엄마가 고마워 꼬옥 안아드렸습니다. 실은 내가 엄마에게 안기고 싶었고 엄마 품에서 실컷 울어보고 싶었습니다, 또 엄마가 유독 나에게만 무심했던 이유가 뭔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큰 언니는 “넌 정말 특별 대우로 컸어. 너 공부 잘한다고 엄마가 너를 제일 좋아했어. 넌 엄마의 자랑이었지 난 사실 네가 부러웠는데 네가 그런 생각을 하며 섭섭해했다니 참 알 수가 없구나! 엄마는 아버지 없이 커서 차가운 사람이라 표현할 줄 몰라서 그런 건 아닐까?”
얼음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처럼 엄마와 싸운 적도 없고 함께 살며 티격태격 한 적도 없으니 화해할 것도 없습니다. 늘 바빴던 엄마 대신 내 안에 투정 대상으로 만든 엄마였는지도 모릅니다. 섭섭해하며 원망하던 허상이 깨진 후 한차례 몸살을 겪었습니다.
나의 아이들에게는 어떤 엄마였을까를 직접 물으며 반성하며 기도하며 허상이 깨진 공간을 채워 갑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잠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