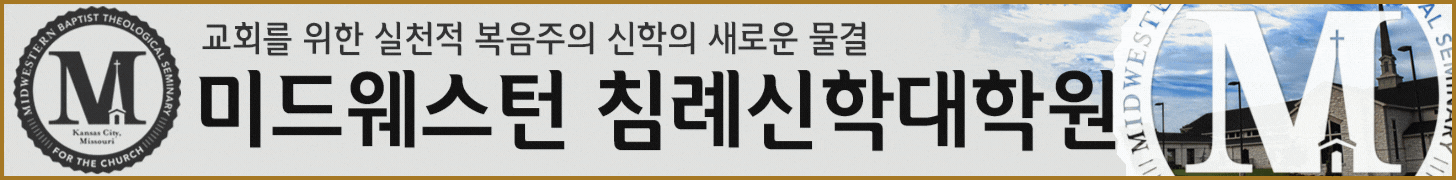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부교수
사우스웨스턴참례신학교(South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는 보수신학교에 속합니다.
그런 신학교에서 배우는 신학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교인들이 소화하기 어려운 신학적 관점을 접하게 됩니다. 나와 함께 수업을 들었던 형제가 있었는데, 나와 같은 학생선교단체에 있었고, 대학교도 같았기에 가까운 인연으로 만나서, 같은 수업을 들으면서 배운 것에 대한 토론을 많이 했지요. 그 형제는 나와는 달리 교회에서 배운 대로 흔들림 없이 신학교로 온 경우였습니다.
그와 반대로 나는 혼자서 성경연구를 위한 신학책을 찾아다녔기에 다양한 신학적 견해에 좀 더 눈을 뜬 정도였지요. 적어도 교수가 왜 그런 내용을 말하는지 소화를 해 낼 수 있는 정도였지요. 그런데 수업 내용이 소화가 안된 그 형제는 수업을 마치고 나서는 당혹스러운 표정을 짓는 때가 많았습니다. 보수 신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도 저렇게 당혹스럽다면, 교회는 신학의 뒤 끝에 머물러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신학교에서 배운 것을 교회에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랬다가는 신앙을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 때문일 겁니다.
그 형제가 수업 후에 곤혹스러워할 때마다 나는 신학적 관점의 근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면, 이해를 하면서도 여전히 힘들어했습니다. 자기도 소화가 안돼서 힘든데, 일반 교인들은 어떨 것인지 염려가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묻더군요. “선교사님은 목회 현장에서 신학교에서 배운 것을 그대로 가르칠 겁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면, 성도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나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나는 그 신학적 관점이 성경적으로 근거가 있다면, 솔직하게 알려줄” 거라고 말입니다. “혹시 그 내용이 성도들이 당혹스러워할지라도, 수정되어야 할 것이라면, 알려야 하고, 그래야 더 건강한 믿음을 가질 거라 믿는다”는 게 나의 입장이었으니까요. 다만, 새로운 관점을 소개하는 과정이 매우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겠지요. 이런 면에서 새롭게 제기된 신학적 관점을 성도들에게 알리는 것 또한 목회자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이것 또한 말씀에 대한 ‘정직성’이라 할 수 있겠지요.
내가 뛰어들었던 선교사의 삶도 이런 투명성을 요구하더군요. 당시에 선교사는 목사 출신이라는 공식이 워낙 견고했기 때문에 아무런 신학 훈련도 받지 않은 내가 선교사가 된다는 것에 신뢰를 보내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선교사를 후원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는 게 가장 큰 이슈였겠지요. 그런 면에서 내가 선교사로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길은 내가 어떤 선교사인지 드러나야 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선교사 생활 초기에는 후원이 쉽지 않았지만, 드디어 사역지로 들어가게 되면서 교회는 나의 선교사 됨을 인정하게 되었던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선교사 훈련생이 된 이후 5년이 되어서야 얻은 신뢰였습니다. 그러고는 선교지에서 16년 동안 보내면서, 교회와 개인 후원자와의 진솔한 소통을 모색했고, 안식년에 교회를 방문했을 때도 선교지의 생활을 있는 그대로 나누었습니다. 기도편지에는 사역 보고 대신에 부족 마을에서의 일상 삶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진솔하게 나눴지요.
이런 만남과 소통이 결국에는 후원자들의 신뢰를 얻은 것 같네요. 선교지에서 수 년 동안 내적 문제로 기도편지를 보내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신뢰해 준 교회가 고마웠습니다. 나중에 방문해서 수년 동안 기도편지도 보내지 못했는데 지속적으로 후원해 주신 이유를 물었더니, “우리는 선교사님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라고 하더군요.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움볼디 부족 마을에 있을 때, 적응하기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음식이었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양념이 없습니다. 기껏 사용하는 게 소금인데, 그것도 돈이 있는 가정이나 사용하지 나머지는 그대로 먹더라고요. 게다가 코코넛밀크에 고구마, 타로, 바나나를 넣고 끓이고, 그 위에 야채를 올려 익히는데, 맵고 짠맛에 익숙했던 나에게는 정말 곤욕이었습니다. 아내와 두 딸은 그 음식을 서로 먹겠다고 야단인데, 나와 아들은 떨떠름한 표정을 짓곤 했지요. 하지만 선교사는 현지 음식을 자기 음식처럼 맛있게 먹어야 한다고 배웠기 때문에 정말 고민이 많이 되었지요. 그러다가 첫 임기가 끝나고 얼마 안 있으면 안식년으로 본국으로 가게 되었을 즈음이었습니다. 한국에 가면 교회에서 선교 보고할 때, 분명히 음식에 관해 궁금해할 텐데,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되더군요. 그 음식을 잘 먹는다고 하면 거짓말이 되고, 잘 못 먹는다고 하면 선교비가 줄어들 것 같은 염려가 생기더군요. 그래서 한동안 고민이 되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수년 전에 이 지역에 정기적으로 방문했던 두 천주교 신부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신부는 이 지역 음식을 너무 잘 먹었는데, 현주민들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서 사람들이 싫어했다는군요. 다른 신부는 현지 음식에 적응이 안 돼서 자기 음식을 싸가지고 다녔다고 하는데, 그 신부 얘기를 하는 마을 사람들의 표정에서 그에 대한 애정이 담겨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나는 마음이 훨씬 편해졌지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서 얘기할 명확해졌기 때문입니다. 예상했던 대로 음식에 관한 질문에, 현지 음식에 아직은 서툴지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친구 되려는 마음이 크다고 진솔하게 나누었지요. 이런 답변에 교회는 나를 더 신뢰하는 것 같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