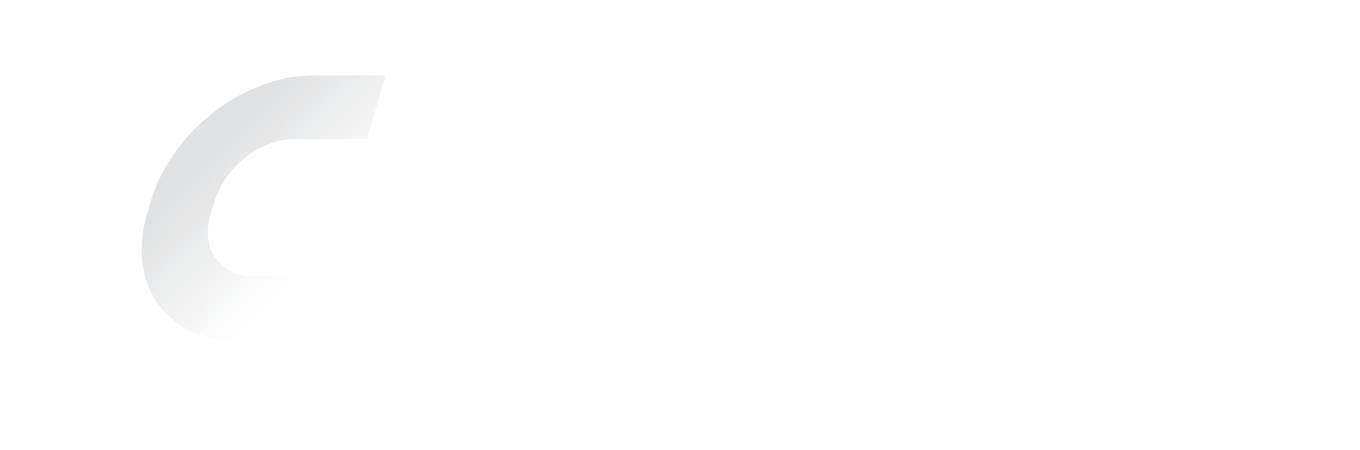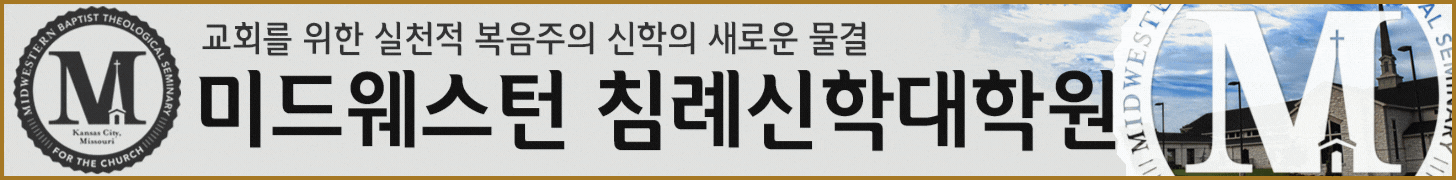거라사인의 지방

한국 땅에 기독교가 도래하기 전 조선은 유교 국가였으나 민간신앙의 형태로 샤머니즘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샤머니즘적 정서는 이후 기독교 신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으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외래 종교인 기독교를 쉽게 받아들이도록 돕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한국 기독교의 신유(神癒) 및 축귀(逐鬼) 사역은 샤머니즘적 정서에 기반을 두고 행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배경 때문인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등장하는 귀신 들림과 예수님의 축귀 사역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마가복음 5장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거라사 광인을 치유하신 이야기는 군대 귀신이라는 악한 세력의 위용과 그 군대 귀신이 빙의(憑依)한 돼지 떼가 비탈길을 달려 호수에 빠져드는 갈등 해소의 장면이 어우러져 만들어 내는 극적 서사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문제를 자아내기도 합니다. 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8장에서는 이 사건의 배경이 되는 지역을 거라사가 아니라 가다라라고 전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대체 어디에서 발생한 것일까요? 거라사입니까, 가다라입니까?
거라사는 오늘날 요르단 중북부에 위치한 제라쉬(Jerash)라는 도시와 동일시됩니다. 제라쉬가 갈릴리 호수와 직선거리로 30마일가량 떨어져 있는데, 이천 마리나 되는 돼지 떼가 그 먼 거리를 질주하여 갈릴리 호수에 빠져 죽게 되는 것을 마가복음의 저자가 목격하여 기록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그래서 비평적 학자들은 마가복음의 본문이 후대에 삽입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본문의 고대성에 의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가장 쉬운 해결법은 마태복음이 제시하는 가다라를 마가복음이 어떤 이유에선가 거라사로 기록했다고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거라사가 넓은 행정 지명으로는 가다라라고 불렸었다는 얼버무리는 설명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히 틀린 설명입니다. 거라사와 가다라는 모두 데가볼리(Decapolis)에 속하는 각각의 도시 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혼동을 더하는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동편에 ‘쿠르시(Kursi)’라는 지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쿠르시라는 지역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쿠르시는 마가복음 5장의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300여 년 후인 비잔틴 시대 때 수도원이 세워진 곳입니다. 현재 발굴되어 남아 있는 것도 모두 비잔틴 시대 수도원의 흔적들뿐입니다. 그러니 쿠르시를 거라사 이야기의 배경으로 보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입니다.
그렇다면 거라사는 어디일까요? 이 문제는 의외로 쉬운 곳에서 풀립니다. 성경 본문을 자세히 읽으면 됩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은 사건의 배경을 ‘거라사’라고 지칭하지 않고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 전합니다. 거라사인의 지방이라는 표현은 거라사인들이 거주하던 지역을 지칭하기 위해 선택된 표현입니다. 많은 거라사인들이 모여 집단 거주를 하던 지역이었기에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표현했던 것이지요. 마가복음이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표기한 장소를 마태복음은 정확한 도시 이름을 사용하여 표현합니다. 바로 가다라입니다. 가다라는 오늘날 요르단 최북부에 위치한 움까이스(Umm Qais)와 동일시됩니다. 가다라 역시 데가볼리에 속하는 도시였고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가다라의 북쪽 끝 언덕에 서면 멀기는 하지만 갈릴리 호수까지 이어지는 긴 비탈길을 한눈에 볼 수 있고 갈릴리 호수의 일부도 시야에 들어옵니다.
가다라에 거라사인들이 많이 이주하여 집단 거주를 하게 된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갈릴리 주변 지역은 헬라 시대에 군사적 가치를 주목받았습니다. 로마 시대에도 여전히 이 지역에 로마 군단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돼지는 로마군의 식량이었습니다. 군집 동물이 아닌 돼지를 떼로 길러야 하는 상황이 생겼던 것이지요. 그러나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로마의 군대를 위해 그들의 식량으로 쓸 돼지를 떼로 기르는 일은 할 수 없었습니다. 돼지는 유대 전통에서 부정한 동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로마 당국은 돼지 키우는 일을 위해 또 다른 대도시인 거라사에서 대규모 주민 이주를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같은 지역을 두고 ‘가다라’와 ‘거라사인의 지방’이라는 다른 두 표기법이 발생하게 된 것이지요. 마가는 예수님의 사역이 유대 지역을 넘어 이방 지역까지도 확장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싶었기에 이방 지역인 거라사인의 지방이라는 명칭을 의도적으로 사용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단 한 글자도 허투루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표현을 빌려 ‘일점일획(一點一劃)’도 아무런 의미 없이 기록된 것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가는 갈릴리 지역에서 이루어진 예수님의 사역에 자신의 복음서 전반부를 할애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전반부 역시 유대 지역에서의 사역과 이방 지역에서의 사역이 구분되는데, 그 기점이 바로 거라사 광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유대인들의 거부와 배척이 점증하는 중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저편(막 4:35)’으로 건너가 ‘거라사인의 지방(막 5:1)’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즉, 거라사’인의’ 지방이라는 표현은 인종을 초월하여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긴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글자마다 새겨져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복된 삶 사시길 축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