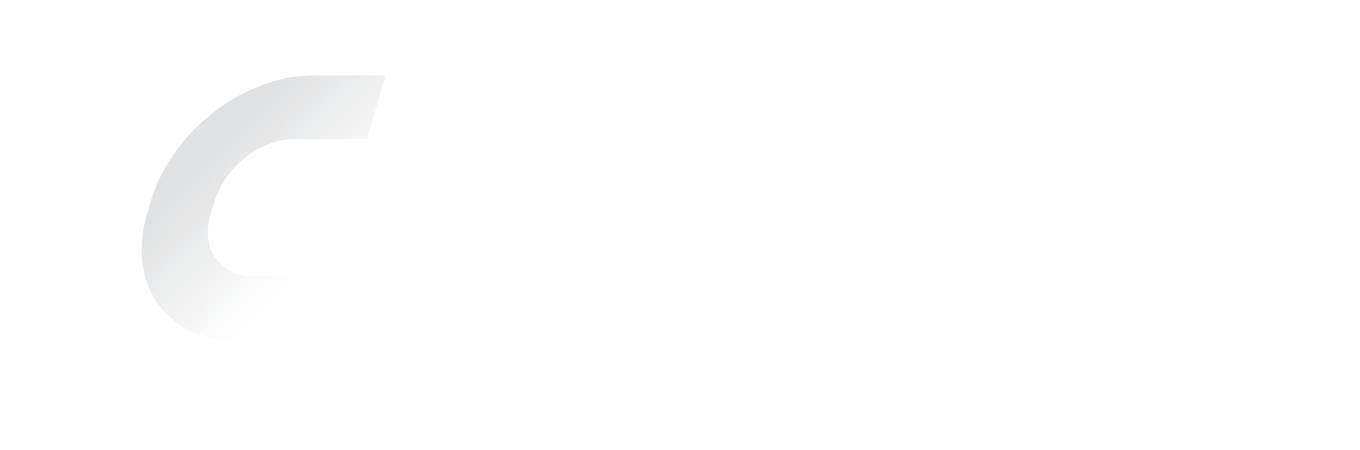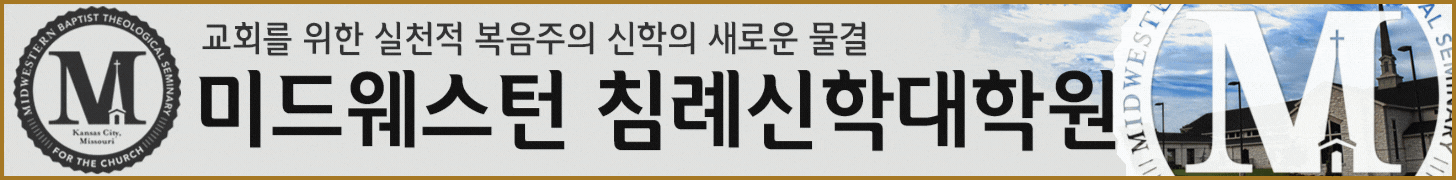기독교교육학 교수 재임
달라스 뉴송교회 협동목사
어떤 학생의 부인이 교수실에 찾아와 남편이 수업에 결석할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미리 알려준 것은 고마웠지만, 딸 또래의 부인이 하는 말이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이랬습니다. “저희 전도사님이 오늘 편찮으셔서 강의에 못 들어가신데요.”
그 부인은 압존법에 관해 전혀 모르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압존법은 한국어 높임법의 하나입니다. 공식적인 문법규정은 아니지만 문법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압존법의 “압(壓)”은 ‘누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존은 “높임(尊)을 누른다”는 말입니다. 압존법은 듣는 사람(청자)을 기준으로 하는 어법으로서, 대화 중에 말하는 사람(화자)이 언급할 대상이 비록 높여야 할 사람이지만, 청자가 더 높을 때, 그 대상에 대한 공대를 줄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비서가 사장에게 말할 때, “전무님께서는 지금 출장 중이십니다”라고 하지 않고, “전무는 지금 출장 중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압존법입니다. 대상(전무)이 화자(비서)보다 높지만, 청자(사장)가 대상보다 더 높으므로 대상을 청자보다 낮춘 것입니다. 후배가 선생님 앞에서 선배에 대해 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배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선배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청자에 대한 존중과 예의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압존법에 따라 시아버지나 시어머니 앞에서 남편을 가리켜 말할 때 “걔”라고 하는 것이 전통적인 예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찾는 시아버지에게 며느리가 “아버님, 걔가 잠시 바깥에 나갔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걔라는 표현이 비칭화됨에 따라, 즉 원래는 존중의 의미를 담고 있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낮추어 부르는 말로 변해감에 따라, 남편을 걔로 지칭하는 것이 어색하고 부담스럽게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남편을 지칭하여 “걔”라고 하는 관습은 없어졌습니다.
과거에는 압존법을 중시했습니다. 특히 군대가 압존법에 진심이었습니다. 상하 관계를 분명히 하여 위계질서를 바로 유지하기 위해서 였습니다. 그래서 병사가 중대장에게 “소대장님께서 면회를 신청하셨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소대장이 면회를 신청했습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일병이 병장에게 “김 상병님이 오셨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김 상병이 왔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2016년 2월 24일 압존법 사용을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3월 1일 “압존법 및 다나까 말투 개선지침”을 하달했습니다. 다나까 말투는 대화 가운데 모든 서술문은 “다”로 끝내고 모든 의문문은 “까”로 끝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병들이 복잡한 위계질서 속에서 상급자의 서열을 파악할 수 없어서 압존법과 다나까식 대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좀더 수평적이고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개선지침을 내린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소속된 한국어 연구기관인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압존법은 전통적으로 가정 내에서 또는 사제 간에 사용되었으나 사회적 관계에서는 전통 예절이 아니라 하나의 관습입니다. 또한 압존법은 어문규정에서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강요할 것이 아니라 표준언어예절을 참고하라는 것이 국립국어원의 입장입니다.
압존법과 상대적인 개념의 가존법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가존법의 “가(假)”는 ‘거짓’을 의미합니다. ‘거짓 높임’이라는 말입니다. 화자가, 청자를 배려하여, 높이지 않아도 될 대상을 높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의 아들에게 말하면서 “자네 부친은 어렸을 때부터 정말 영특하셨어”라고 친구를 높이는 것이 가존법입니다.
물론 언어는 사회적 약속이기 때문에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꽃을 나비라고 부를 수 없고 산을 강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남자를 여자라고 할 수 없고, 여자를 남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언어는 유기적이어서 생성되고 변화하고 확장 또는 소멸되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컴퓨터, 인터넷, 핸드폰 같은 단어들은 근대에 생겨난 것들입니다. 옛날에는 “어리다”는 단어를 ‘어리석다’라는 의미로 사용했지만, 지금은 ‘나이가 적다’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예배를 본다”는 말을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로 사용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식모, 차장, 공돌이 등등의 단어들은 사라졌습니다.
요즘에는 킹받네(열받네), 어쩔티비(어쩌라고), 낄끼빠빠(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 등등의 줄임말들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금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압존법이나 가존법과 무관하게 사물높임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고객님, 주문하신 아메리카노 나오셨습니다.” “하나에 5천원이세요.” 커피와 돈을 공대하는, 참으로 이상한 표현이 귀에 거슬립니다.
이렇듯 언어의 유기적 특성 때문에 옛날에 사용하던 어법이나 표현만 고집할 수는 없습니다. 요사이 한국어는 화자를 기준으로 존대하는 것을 언어예절이라고 합니다. 청자와 대상 사이의 관계에 상관없이 화자를 기준으로 하여 둘 다 윗사람이면 모두 존대한다는 것입니다. 즉, 손자의 입장에서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두 분 다 윗사람이므로 “아버지께서 할아버지께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언어의 변화와 함께 압존법과 가존법을 고집하는 시대는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맞추어 청자를 배려하고 높이는 자세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을 하기에 앞서 청자가 어떻게 느낄지를 한 번 쯤은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문법이나 예절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고 가르칩니다. 압존법과 가존법에 있어서도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것이 정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