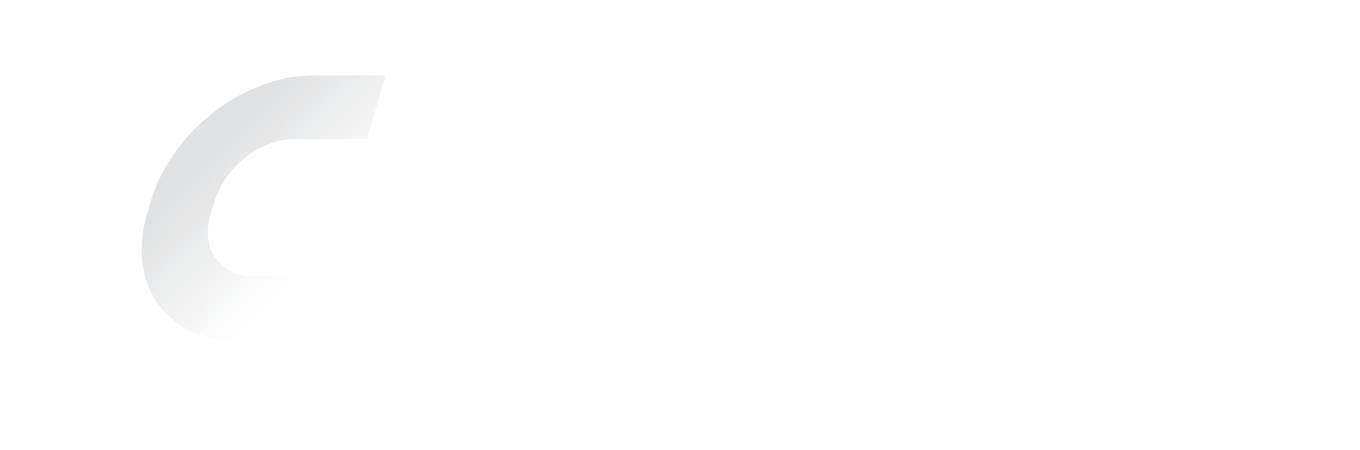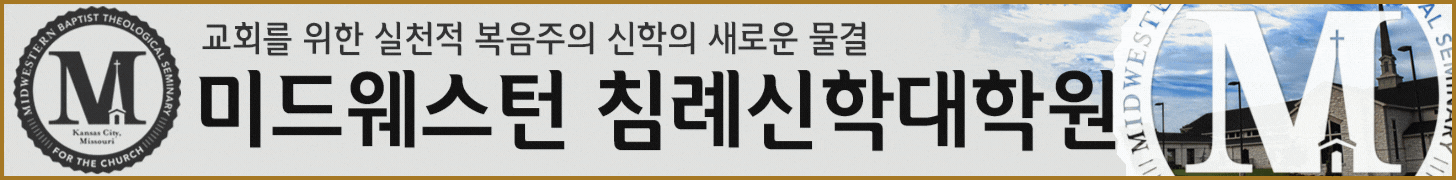한국 사회가 무속에 병들고 있다. 정치권까지 무속 관련 풍문이 끊이지 않고, 불안정한 시대 속 무속에 미래를 점치는 이들이 크게 늘었다. 정치 리더십을 비롯해 사회 곳곳에 무속이 일상화될 정도로 우리 사회의 병리적 징후가 심각하다는 경고음이 나온다.
무속은 과거에는 단지 미신과 하위 문화의 일종으로 치부됐다. 하지만 오늘의 현실은 무속이 우리 사회에 보편화·양지화됐다는 사실이 통계로 확인될 만큼 위기 경보를 보내고 있다.
지난해 통계청에 따르면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 사업체 수는 9,391개, 종사자는 1만19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년 전에 비해 각각 5% 증가한 숫자다. 정식 사업체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아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국내 무속인 규모를 짐작할 수 있는 대한경신연합회와 역술인연합회 가입자 수도 약 80만명으로 2000년대 초반에 비해 4배가량 늘었다.
최근 들어 무속 확장이 매서운 건 사회 불안 증가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역사적으로 급격한 사회변화 때마다 무속이나 초자연적 존재에 의지하는 경향이 반복돼왔다.
문화심리학자 한민 박사는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든, 수험생을 둔 부모든, 결혼을 앞둔 젊은이든 상관없이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인간은 비이성적인 것을 따르고 믿으려는 마음이 강해진다”면서 “국가적 난제에 대해서도 언론·학계보다 시원한 풀이를 해주는듯하니 솔깃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의 심각성은 사회 불안을 안정되게 이끌어야 할 국가 정치지도자들까지 무속에 빠지는 세태가 되면서 사회 전반에 무속이 확산하고 있다는 데 있다.
우리 사회는 현재 무속으로 인해 정치 리더십이 휘둘리고 결국 정치적 불안정으로 추락하는 현실을 보고 있다. 무속과 결탁한 정치의 말로를 봤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천공’, ‘건진법사’, ‘명태륜 미륵’에 이어 ‘노보살’에 ‘비단 아씨’까지 거론되며 정치권과 무속과의 결탁이 끊임없이 문제로 제기됐다.
이 저변에는 비과학적 신념에 대한 과도한 의존과 운명론적 정치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실제로 무속인 다수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정치적 시운(時運)을 파악해야 하는 고위 정치지도자와 경제의 흐름을 읽어야 하는 주요 기업가들의 상당수가 무속에 의존한다고 한다.
가장 큰 문제는 무속 신앙이 파고들 정서적 토대가 조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목회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우리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종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종교화도 가속화하고 있다. 2004년 57%였던 종교인구는 2023년 36.6%로 줄은 것으로 집계됐다. 개신교의 경우 2012년 22.1%로 최고점을 찍은 뒤 계속 감소해 2023년 기준 15%대로 떨어졌다.
특히 무종교인의 종교의식 조사 결과, 무종교인 가운데 종교에 관해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5명 중 1명도 채 되지 않았다. 반면 무종교인의 40%는 지난 1년간 사주나 타로 등 무속·미신 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했는데, 이는 조사대상국 중 압도적 1위로 2위 일본과 베트남(16%)을 크게 앞지르는 수치다.
다만 무종교인들의 38%는 신 또는 초월적 존재를 믿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영적인 차원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대로라면 무속이 종교의 자리를 대신할 날도 머지않아 보인다. 정재영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과거 미신으로 치부되던 무속이 오히려 요즘 세대에게 호감을 사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다”면서 “개신교의 신뢰가 사회적으로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교회는 사람들의 현실적인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