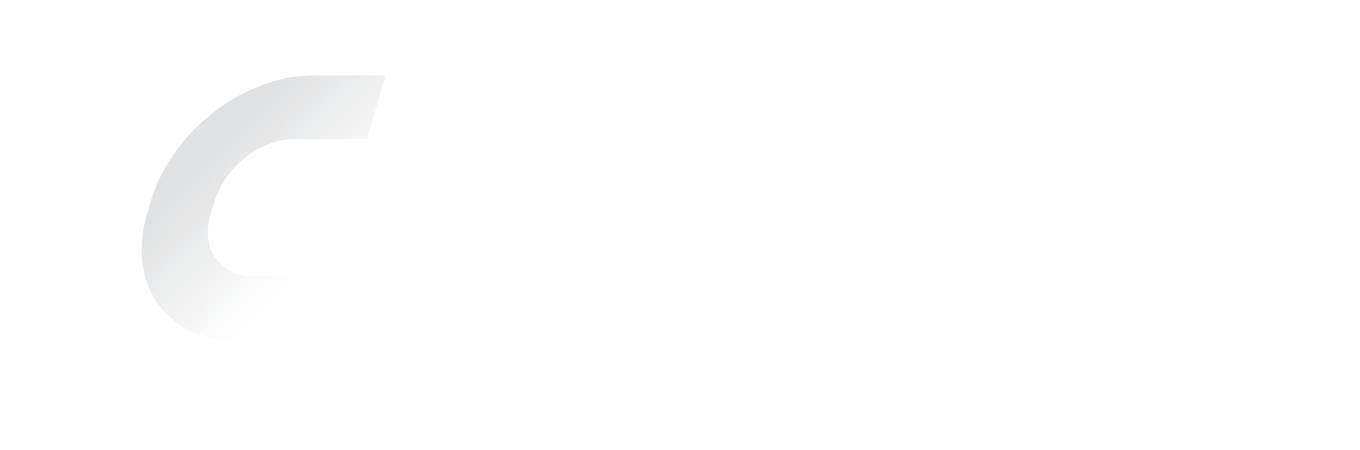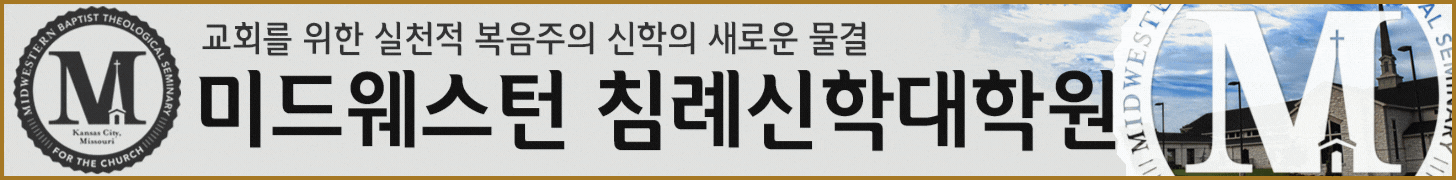Dallas Baptist University 겸임교수
1986년에 글로벌 제약회사인 화이자(Pfizer)는 협심증(Angina Pectoris)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혈관 이완제 개발에 착수했다.
좁아진 심혈관으로 인해 가슴의 통증을 느끼는 협심증 환자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신약 개발 프로젝트였다.
한편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혈관에 관하여 밝혀진 놀라운 사실 중 하나는 혈관 내벽 세포는 특이하게도 대기 오염 성분이기도 한 일산화 질소(NO)를 스스로 만들어 혈관을 이완시킨다는 점이었다.
혈관 내피 세포에서 만들어진 일산화질소(NO)는 cGMP라는 신호 전달 물질을 만들어 내는데 이 물질이 세포내 칼슘 농도를 낮춰 혈관을 이완 시켜주게 된다.
또 한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다이너마이트의 원료인 니트로글리세린 (Nitroglycerin)이 급성 협심증을 완화시키는 응급 처치약으로 100년 넘게 쓰이고 있다는 점이다.
주로 설하정, 즉 입 속 혀 밑에 알약을 넣는 형태로 응급 처치되는데 한마디로 좁아진 심혈관을 이완시키기 위해 다이나마이트 성분을 환자의 입에 넣어 주는 셈이다.
이 알약은 소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혀 밑에 있는 정맥을 통해 바로 심장으로 전달되어 몇 분 내에 신속하게 혈관을 이완시키게 된다.
약물 기전은 다름 아닌 니트로글리세린이 일산화 질소(NO)를 공급하고 이어서 세포내 cGMP를 증가시키는 것이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제약회사 화이자는 무엇보다 혈관확장을 유도하는 신호전달물질인 cGMP의 양을 증가시켜 줄 전략을 모색하게 된다.
세포 신호 전달의 경우 물질의 합성과정이 있다면 분해과정이 있기 마련인데 화이자는 다름아닌 cGMP를 제거해 주는 효소인 PDE (Phosphodiesterase)에 주목했다.
흐르는 강물에 댐을 설치하여 물을 확보하는 것과 같은 이치로 PDE를 억제하여 세포내 cGMP양을 늘려보자는 계획이었다.
현재까지 사람의 몸엔 11종류의 PDE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연구팀은 그 중에서 혈관과 혈소판에 특이적으로 발현되고 있는 PDE5의 억제제를 개발하기로 방향을 잡게 된다.
마침내 화이자 연구팀은 효과적으로 PDE5를 억제하는 분자를 찾게 되었는데 그 이름을 UK-92480이라 명명했다.
이것은 나중에 실데나필 (Sildenafil) 이란 성분명을 갖게 되고 그것의 제품명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아그라 (Viagra)이다.
적은 농도로도 선택적으로 PDE5만을 억제했던 실데나필은 동물실험에서 훌륭한 혈관 이완 효능을 보였을 뿐 아니라 혈소판의 응집을 억제하여 혈전을 낮추는 효능도 갖고 있어서 협심증과 심혈관을 보호기능에 탁월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1991년 임상 실험에서는 예상과는 달리 기대 수준에 못 미치는 효능과 다른 부작용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안면 홍조, 두통, 소화 불량, 색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시력의 변화와 같은 부작용이 있었다.
일부 환자들에게서 성기가 발기(Penile erection)되는 부작용이 보고 되었지만 그 당시 심혈관 치료제로서의 효능이 주요 목적이었기 때문에 부작용일 뿐 중요한 성과로 주목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약의 반감기가 짧아서 적어도 하루에 세번 이상 복용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협심증 만성질환 환자에게는 큰 부담일 수 밖에 없었다.
불행히도 1993년을 지나면서 실데나필은 더 이상 협심증 약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사정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1980년대 이전까지 발기 부전이란 증상은 매우 사소하고 개인적인 문제이며 스트레스와 같은 심리적인 문제로 치부되었는데 비뇨기학에서는 이를 개선하려는 방법을 나름 찾고 있었던 터였다.
해당 조직에 직접 주입하는 주사제 보다는 효능이 일시적이고 경구용 치료제가 절실하던 상황에 실데나필의 부작용으로 여겨졌던 바로 그 점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새로운 임상 실험을 통해 화이자의 PDE5 억제제는 안전성과 효능이 입증되어 1998년 FDA로부터 발기 부전 치료제로 허가 받게 되었다.
바이아그라의 출시는 전 세계적인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경구용 발기 부전 약물은 성에 대해 드러내 놓고 이야기하기에 꺼리던 사회 문화적 경향을 질환으로 인정하게 만들었고 누구나 말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꾸어 놓게 되었다.
주목할 점은 바이아그라가 성공한 약임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지만 원래 목적으로 삼았던 협심증을 치료하는 데에는 실패한 약이었다는 점이다.
반전은 그저 부작용에 불과했던 점을 오히려 가능성으로 눈여겨 보며 협심증 치료제에서 발기부전 치료제로 재목적화한 것이 약의 운명을 갈라 놓았던 것이다.
그 이후 임상 실험에서 안전성은 입증되었으나 효능이 약해 버려지다시피 한 약들이 다시 주목을 받게 되었다.
NIH에 따르면 7천 가지가 넘는 희귀 질환병이 존재하는데 기존의 약들을 재목적화(Drug repurposing)라는 치료제를 찾고자 하는 패러다임이 제약 산업에 이미 형성되게 되었고 바이아그라는 그 성공 사례로 늘 회자되고 있다.
바이아그라 스토리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바로 재목적화 (Repurposing) 라는 개념이다.
어느 한가지 일에 실패했을 때 재목적화라는 개념을 갖고 분석해보면 실망스러운 부작용조차 기대 이상의 다른 활용점이 되는 찾는 경우가 있다는 교훈이다.
성급히 실패라는 낙인을 찍어 내어 버리는 일에 익숙한 우리에게 재목적화 개념이 스며들어 창조적인 인생을 열어갈 수 있길 기도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