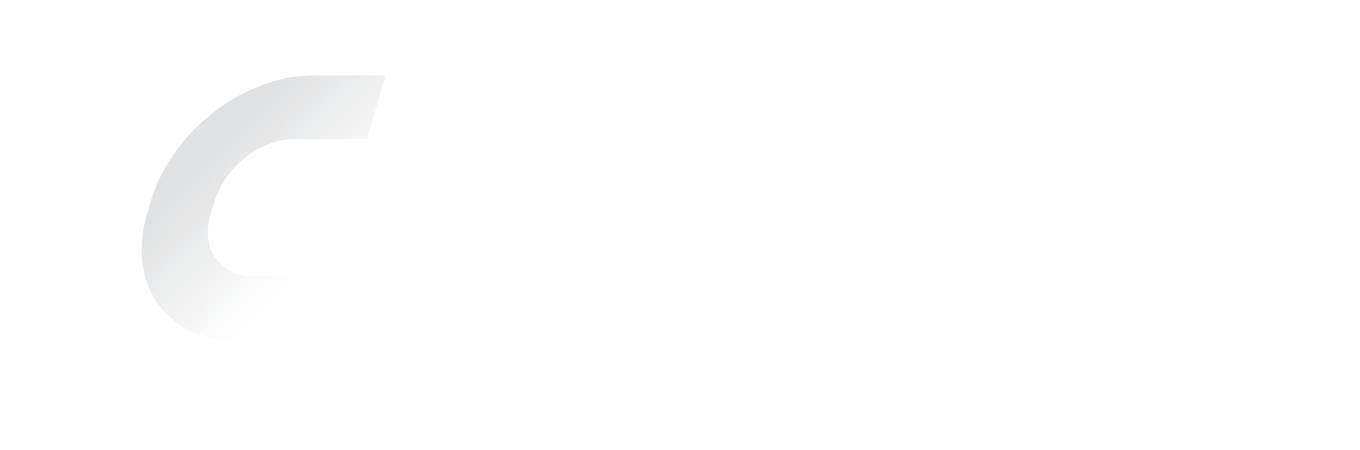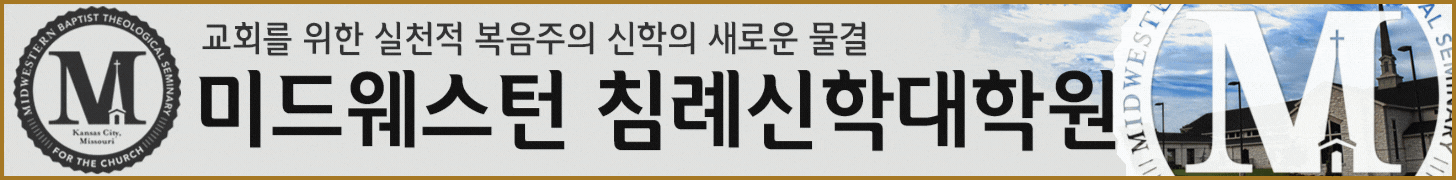UT사우스웨스턴 의과대학에서 콜레스테롤 대사관련 질병을 연구하는 과학자이다.
현재 Dallas Baptist University에서 겸임교수로 학생들에게 생명 과학을 가르치고 있다.
영국 BBC earth에서 제작한 독화살 개구리에 관한 흥미로운 내용이다. 아마존에 서식하는 독화살 개구리(Poison Dart Frog)는 연못 주변이 아니라 식물 안에 고여 있는 작은 물속에서 소수의 올챙이만을 기르는 습성이 있다. 식물 안에 있는 물이라 종종 물의 수위가 낮아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때 올챙이는 질식할 위험에 처한다. 올챙이는 아직은 폐가 아닌 아가미로 호흡하는 단계이기 때문이다. 이 상황을 파악한 아빠 개구리의 행동에 카메라의 초점이 맞춰졌다. 흥미롭게도 아빠 개구리는 마치 사람이 아기를 등에 업듯이 올챙이를 등에 업고 물에서 나와 다른 물웅덩이를 찾아 나섰다. 올챙이는 신기하게도 미끄러지지 않고 아빠 등에 가만히 업혀 물 밖으로 나와 옮겨졌다. 그러나 옮긴 장소에서 올챙이가 먹을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파악한 아빠 개구리는 그제야 엄마 개구리를 호출했다. 젖 먹이는 포유류도 아닌데 엄마 개구리라고 도움이 될까? 놀랍게도 엄마 개구리는 웅덩이에 들어가 수정되지 않은 알을 낳아 올챙이에게 내어 주었다. 올챙이는 그것으로 허기를 채우고 성장을 이어갔다. 엄마는 올챙이를 위해 자신의 무(無)수정란을 비상 이유식으로 사용한 셈이다. 양서류 90%의 종들이 알을 낳은 이후 새끼를 돌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독화살 개구리는 정성으로 새끼를 돌보는 편에 속한다. 예상을 뛰어넘는 독화살 개구리들만의 독특한 육아 방식은 말 그대로 경이롭기만 하다.
경이로움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독화살 개구리들의 생존방식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독화살 개구리는 눈에 띄는 밝고 강렬한 색상과 무늬 탓에 예쁘기로 유명하다. 하지만 이 개구리의 체격은 평균 2 – 4cm 정도로 왜소한 편이고 다른 개구리들과 달리 발가락 사이에 물갈퀴가 없어 수영 실력이 좋지 않다. 독화살 개구리가 주행성인 것도 야행성인 다른 개구리들과 다른 점이다. 이 개구리의 속명인 Dendrobates는 Dendro(Tree) 와 Bates(Walker)의 합성어로 “나무 위를 걷는 자”라는 뜻이다. 왜냐하면 연못보다는 나무나 식물 위를 올라 돌아다니는 속성이 있기 때문이다. 내용을 정리해 보면 독화살 개구리는 작고 수영을 잘 못함에도 불구하고 강렬한 색상을 하고 벌건 대낮에 나무 위를 걷는 개구리라는 말이다. 이런 행동 습성은 서슬 퍼런 먹이 사슬 세계에서 포식자의 먹잇감이 되겠다고 자처하는 것과 다름없다. 하지만 여기에는 놀라운 생존 전략이 숨어 있다.
“독화살”이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작은 녀석은 독을 지녔다. 독의 이름은 바트라코 톡신 (Batrachotoxin, BTX), 스테로이드성 알칼로이드 계열의 맹독이다. 아마존 원주민들은 독화살 개구리 피부에서 분비되는 독을 화살촉에 발라 사냥이나 전투에 사용했다. 175종이 넘는 모든 종이 치명적인 양의 독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Golden poison frog라는 종은 한 마리로 1만 마리의 쥐 혹은 10명의 성인을 숨지게 할 수 있는 양의 독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독이 몸에 퍼지면 신경계에서 전기 신호에 의해 열리는 나트륨 채널(Voltage-gated Na+ channel)이 비가역적으로 열리게 되어 발작, 마비, 근육 경련, 부정맥, 심장 마비를 일으키게 된다. 지금까지도 마땅한 해독제가 없다.
하지만 독화살 개구리가 이런 맹독을 처음부터 모두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니다. 개미 같은 곤충들은 식물을 먹으며 미량의 알칼로이드를 몸에 저장하는 특성이 있는데 독화살 개구리는 이런 곤충들을 잡아먹고 알칼로이드를 다시 자기 피부에 농축하여 독의 형태로 분비한다. 식물에서 곤충 그리고 곤충에서 독화살 개구리로 이어지면서 알칼로이드 독이 농축되는 것이다. 하지만 독화살 개구리는 이렇게 농축된 자신의 독을 먹이 사냥에 사용하지 않고 포식자의 행동을 단념하게 만드는 방어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방어용 맹독이 있다지만 이것만으로 독화살 개구리는 자신을 보호할 수 없다. 자신에게 독이 있다는 사실을 포식자가 몸소 경험하기 시작했을 땐 상황은 이미 늦은 것이다. 잡아먹히기 전에 미리 경고하는 일이 필요하다.
먹이 피라미드에서 하위에 위치한 약자들은 포식자의 눈에 띄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 보호색 (Camouflage)을 사용한다. 포식자가 지나갈 때면 주변환경과 비슷한 색을 띠고 숨죽이고 있어야 살아 남기 때문이다. 하지만 독화살 개구리를 포함하여 무당벌레, 제왕나비 같은 약자들은 반대로 눈에 띄는 강렬한 경계색 (Aposematism)을 사용한다. 이는 자신에게 독이 있음을 포식자에게 분명히 경고하기 위함이다. 여기서 독과 경계색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독이 없는 경계색은 그야말로 눈에 띄는 먹잇감에 불과하니 무모한 것이고 경계색 없는 독은 경고 기능이 없으니 공격에 무방비인 것이다. 이처럼 독화살 개구리의 독에는 경계색이 필요하다.
독화살 개구리의 경계색은 포식자들에게는 “나는 독이 있다” 라는 다소 섬뜩한 경고를 주지만 우리 눈에는 흉악스럽지 않은 아름다운 색상으로만 비춰지는 것이 경이롭다. 결과적으로 경계색은 독화살 개구리가 왜소함에도 불구하고 주눅들지 않고 세상과 맞짱 뜨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힘을 부여한다. 악에게는 섬뜩한 경고이나 하나님의 눈에는 아름다운 형상으로 그리고 세상에서는 나를 당당한 자로 비춰지게 만드는 너의 경계색은 무엇이냐? 마치 독화살 개구리가 나에게 물어 오는 듯하다.